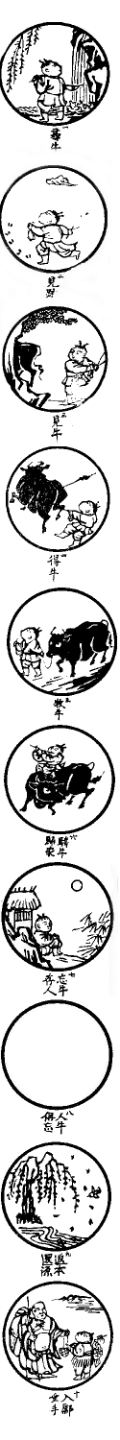『해탈도론解脫道論』에서 말하였다.
“계율ㆍ선정ㆍ지혜는 이른바 해탈의 길이다.
계율이란 것은, 위의威儀의 뜻이며,
선정이라는 것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혜라는 것은 지각知覺의 뜻이며,
해탈이라는 것은 속박을 여읜다는 뜻이다.
다시 계율이란 악업惡業의 때를 없애는 것이며,
선정이란 얽힘[纏]의 때를 없애는 것이며,
지혜란 사使의 때를 없애는 것이다.
또 세 종류의 잘 조복하는 도가 있으니, 이른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은 것이다.
계율이 처음이 되고, 선정이 중간이 되고, 지혜가 나중이 되는 것이다.
어째서 계율이 처음의 착함이 되는 것인가?
정진하는 사람은 퇴전하지 않음을 성취하고, 퇴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쁘고, 기쁘기 때문에 뛸듯하고, 뛸듯하기 때문에 몸이 유연하고,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즐겁고, 즐겁기 때문에 마음이 선정[定]에 드니, 이것을 이른바 처음의 착함이라고 한다.
선정이 중간의 착함이 된다는 것은 선정으로 여실하게 알고 보기[知見] 때문이다.
지혜가 나중의 착함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여실하게 알고 보기 때문에 싫어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욕망을 여의고, 욕망을 여의기 때문에 해탈하기 때문이다.
또 계율로써 악취惡趣를 없애고,
선정으로 욕계欲界를 없애고,
지혜로 모든 존재[有]를 없앤다.”[배자함背字函 제1권]
『발보리심론發菩提心論』에서 말하였다.
“선관禪觀을 닦아 익히는 것은 세 가지 법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니, 이른바
지혜를 들음과
지혜를 생각함과
지혜를 닦음이다.
무엇을 지혜를 들음[聞慧]이라 하는가?
가령 들은 법을 마음으로 항상 사랑하고 즐기면서 싫어함이 없는 것이다.
무엇을 지혜를 생각함[思慧]이라 하는가?
사념思念으로 모든 유위법有爲法의 여실한 상相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른바 무상無常하고 고苦이고 공空하고 무아無我이고 부정不淨이기 때문에 찰나찰나마다 생하고 멸하면서 오래지 않아 무너지는 것이 곧 염리厭離를 낳아서 부처의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다.
무엇을 지혜를 닦음[修慧]이라 하는가?
이른바 욕망과 착하지 않은 법을 여의어서 점차로 닦아 들어가는 것이다.”[명자함命字函]
『현종론顯宗論』의 전장全章을 일관하고 수행 과정에 순서가 있음을 갖추어 본다.
[수修에 들어가는 데에는 부정不淨ㆍ식념息念의 두 가지 관觀이 있고 점차 난煖ㆍ정頂ㆍ인忍ㆍ세제일법世第一法이라는 네 종류의 가행加行의 공功이 일어난다.]
『현종론』에서 말하였다.
“이미 청정한 시라尸羅에 먼저 안주하고, 곧 듣고 생각하고 닦는 것으로 나아가서 진리諦를 본다.
어떤 문門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곧 게송을 설해서 말하였다.
수행에 들어가는 요체에 두 문이 있으니 부정관不淨觀과 식념息念이다.
탐욕과 심尋이 증상增上하는 자는 반드시 차례대로 닦아야 한다.”
논論에서 말하였다.
“수행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두 가지 문으로 들어가야 하니, 첫째는 부정관이고, 둘째는 지식념持息念이다. 또 부정관은 탐욕을 다스리고, 식념은 심尋을 다스린다.
먼저 부정관의 모습을 변별해서 게송으로 말하였다.
네 가지 탐욕을 통틀어 대치하기 위해서는 골쇄骨鎖를 변별해서 관한다.
널리 바다에 이르렀다가 다시 간략해지니 이를 초습업初習業의 지위라 이름한다.
발을 제외하고 머리의 반쪽에 이르는 것은 이숙수已熟修라 이름하고
마음을 묶어서 미간에 두는 것은 초작의超作意의 지위라 이름한다.”
논에서 말하였다.
“부정관을 닦는 것은 탐욕을 올바로 대치하기 위한 것인데, 대략 네 종류가 있다.
첫째는 현색顯色의 탐욕이고,
둘째는 형색形色의 탐욕이고,
셋째는 묘촉妙觸의 탐욕이고,(고려대장경에는 셋째의 묘촉의 탐욕[妙觸貪]이 없으나 신수대장경을 참조하여 보입하였다.)
넷째는 공봉供奉의 탐욕이다.
네 가지 탐욕을 대치하는 데는 두 가지 사택思擇에 의거하니,
첫째는 시체의 안[內尸]을 관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체의 밖[外尸]을 관하는 것이다.
근기가 예리한 자는 먼저 몸의 안에 대해 피부를 경계로 삼아서 발에서 위로 정수리에서 아래로 두루 관찰함으로써 마음으로 하여금 환란을 싫어하게 한다.
만약 근기가 둔한 자라면 번뇌가 맹렬하고 날카로워 굴복시키기 어려우며 외부 인연의 힘을 빌려야만 바야흐로 다스릴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시체의 밖을 명료하게 관찰하여 점차로 자기 마음의 번뇌를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가 처음으로 시체의 밖을 관찰할 때는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시체가 버려진 곳을 찾아가 시체의 밖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거늘 하물며 안의 모습이겠는가? 저쪽의 모습이 이미 그러하였으니 이쪽도 마땅히 그러할 것이므로 마땅히 여덟 가지 상념을 닦아서 네 가지 탐욕을 다스려야 한다.
현색顯色의 탐욕을 대치하기 위해서는 푸른 어혈의 상념[靑想]과 검붉은 상념[黑赤想]을 닦아야 한다.
형색形色의 탐욕을 대치하기 위해서는 먹혀지는 상념[被食想]과 분리되는 상념[分離想]을 닦아야 한다.
묘촉妙觸의 탐욕을 대치하기 위해서는 파괴의 상념[破壞想]과 해골의 상념[骸骨想]을 닦아야 한다.
공봉供奉의 탐욕을 대치하기 위해서는 배가 부풀어 오르는 상념[脹想]과 살이 문드러지는 상념[膿爛想]을 닦아야 한다.
오직 골쇄(骨鎖:白骨)를 반연해서 부정관을 닦아야만 이 같은 네 가지 탐욕을 통틀어 다스릴 수 있다.
수행하는 것에 따라 세 가지 지위가 있다고 설한다.
첫째는 초습업初習業이고,
둘째는 이숙수已熟修이고,
셋째는 초작의超作意이다.
또 부정관을 닦을 때는 마땅히 먼저 자기 몸의 한 부분에 마음을 먼저 묶어 두어야 한다.
혹은 발가락에다, 혹은 미간에다, 혹은 콧등과 같이 좋아하는 곳에다 한결같이 집중해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최초로 마음을 묶어 자기 몸의 발가락 등 구석구석 가정하여 생각[仮想]하다가 아래로 능히 동전 크기만한 백골을 볼 수 있는 데까지 이르면, 뛰어난 이해력을 말미암아서 점차 넓히고 점차 증대시켜 온몸의 골쇄를 갖추어 보는 데까지 이른다.
관행觀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지 상념의 힘[想力]만 따르고, 관행이 이루어졌다면 문득 지혜의 힘을 따른다. 이 지위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념으로 말미암아서 전변하는 것이다.
온몸을 이미 보았다면 다시 바야흐로 방편으로 외부의 백골을 연緣으로 하는 부정관문不淨觀門으로 들어간다.
말하자면 점차적으로 뛰어난 이해가 증대하기 때문에 외부의 골쇄가 자기의 신변에 존재한다고 관찰하는 것이니, 점차적으로 하나의 평상, 하나의 방, 하나의 절, 하나의 동산, 하나의 지역, 하나의 마을, 하나의 나라에 두루하고, 나아가 대지에 두루하고 바다에서 해변까지 그 사이에 골쇄가 가득 찼다고 여긴다. 광활한 범위를 점차 간략하게 관찰하여 안으로 오직 자신의 골쇄만을 관하는 데 이른다. 이렇게 점차로 간략하게 부정관을 이루는 것을 초습업위初習業位라 한다.
또 약관略觀으로 하여금 뛰어난 이해로 점차 증대시키기 위해 자신의 골쇄 가운데 다시 발의 뼈를 제외하고 점차로 머리의 반쪽 뼈를 제거하는 데까지 이르고, 나머지 반쪽의 뼈를 사유하여 마음을 묶어서 머물게 한다. 이렇게 전략轉略 부정관을 이루는 것을 이숙수위已熟修位라고 한다.
또 약관으로 하여금 뛰어난 이해를 자재롭게 하기 위해 절반의 머리뼈마저 제외하고 마음을 미간에 묶어 오로지 하나의 연緣에 집중하여 담연하게 머물게 한다. 이렇게 극략極略 부정관을 이루는 것을 초작의위超作意位라고 한다. 여기에 이르러야 부정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탐욕이 없는 것을 성품으로 삼음으로써 모든 감응하는 바가 다 구경究竟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식념息念을 지니는 것을 변별하는 것이다. 게송에서 말하였다.
식념息念은 혜慧로 5지地이고 바람을 연으로 하고 욕망의 몸에 의지한다.
두 가지로 얻음은 실로 외도에게는 없으며 여섯 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수數 등이다.”
논에서 말하였다.
“아나阿那란 이른바 숨을 지녀 들이쉰다는 말로서 외부의 바람을 끌어들여서 몸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뜻이다.
아파나阿波那란 이른바 지닌 숨을 내쉰다는 말로서 내부의 바람을 끌어내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뜻이다.
또 설하기를, 아나라는 것은 능히 지니고 온다는 것[持來]이며, 아파나라는 것은 능히 지니고 나간다는 것[持去]이니, 들고 나가는 식념이 능히 신풍身風을 지니는 것이다.
이른바 태란위胎卵位에서는 먼저 배꼽에서 업에 의해 생긴 바람이 일어나 몸을 뚫어 구멍을 이루니, 마치 연뿌리의 줄기와 같다. 최초에 어떤 바람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이 입과 코를 타고서 나머지 바람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처음과 나중을 입식入息의 바람이라 한다. 또 안에서 바람이 계속 나가는 것을 출식出息의 바람이라 한다. 마치 연금술사가 풍로의 공기 자루를 열면 저절로 바람이 들어오고, 들어온 뒤에 그것을 주무르면 바람이 다시 나가는 것과 같다. 이는 바람의 성질이 법대로인 것이지 실제로는 들고 나감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바람의 뜻을 드러냄으로써 두 가지 식息을 올바로 밝혔다. 식념을 지녔으므로 선정과 지혜가 이루어진다.
이 염念의 소의所依는 오직 5지地에 통할 뿐으로 이른바 욕계와 정려靜慮 중간과 초선ㆍ2선ㆍ3선의 정려에 의거해서 가깝게 나눈다. 이것은 다만 사근捨根과 상응할 뿐이니 심尋을 대치하기 위해서는 이 염念을 닦아야 하고 여섯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수數이고, 둘째는 수隨이고, 셋째는 지止이고, 넷째는 관觀이고, 다섯째는 전轉이고, 여섯째는 정淨이다.
수數는 이를테면 마음을 묶어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하나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헤아리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계에 너무 매이거나 흩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세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는 수를 덜 헤아리는 것이며, 둘째는 수를 더 헤아리는 것이며, 셋째는 헤아리는 것이 뒤섞이는 것이다. 다시 세 가지 잘못이 있으니, 첫째는 너무 느슨한 것이며, 둘째는 너무 급한 것이며, 셋째는 산란한 것이다. 만약 열을 세는 중간에 마음이 산란해진다면 다시 하나부터 순서대로 헤아리고 마친 뒤에 다시 시작해야 선정[定]을 얻게 된다. 무릇 숨을 헤아릴 때는 반드시 들숨을 먼저 세어야 하니 처음 태어나는 지위[初生位]에선 들숨이 앞서 있고, 죽을 때 이르러서는 날숨이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태어나고 죽는 지위를 각찰覺察하기 때문에 비상非常의 상념으로 점차 닦아 익힐 수 있는 것이다.
수隨는 이를테면 마음을 묶어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쫓되, 들어오고 나가는 숨이 짧은지 긴지 멀리 이르는지를 염念하고, 다시 반대로 되돌아와 어디에 미치는지를 염하는 것이다. 그 숨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가 목구멍ㆍ심장ㆍ배꼽ㆍ넓적다리ㆍ무릎ㆍ발목ㆍ발꿈치ㆍ발가락에 이르기까지 염念이 항상 쫓는 것이다.
지止는 이를테면 염念을 묶어 오로지 코끝에 두거나 혹은 미간에 두거나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좋아하는 곳에 두고 그 마음을 편안히 쉬게 한 채 숨이 몸에 머무는 것이 마치 구슬 속의 실과 같음을 관하는 것이다.
관觀은 이를테면 이 숨의 바람을 관찰하고서 숨과 함께 작용하는 대종(大種:四大)으로 이루어진 색色과 색에 의거해서 머무는 마음과 심소心所를 아울러 관찰하는 것으로 다 같이 5온을 경계로 삼아 관찰하는 것이다.
전轉은 이를테면 이전移轉하는 것이다. 숨의 바람을 소연으로 한 감각을 나중의 나중인 뛰어난 선근 속에 안치하는 것이니, 즉 염주念住로부터 시작하여 세제일법世第一法에 이르는 것이다.
정淨은 이를테면 8견도見道 등으로 단계를 높여 나아가는 것이다. 나중에는 전轉과 진지盡智 등을 바야흐로 정식상淨息相이라 하였다.”[자자함自字函 제9권]
두 문을 닦아 들어감으로써 마음이 정定을 얻으니, 다시 무엇을 닦겠는가? 게송에서 말하였다.
이미 닦은 걸 의거해서 지止를 이루었고
관觀을 성취하기 위해 염주念住를 닦아야 하니
자상自相과 공상共相으로써 몸의 감각[受]과 심법心法을 관찰하는 것이다.”
논論에서 말하였다.
“이미 닦아 성취한 지止를 소의所依로 삼아 관觀을 조속히 성취하기 위해 네 가지 염주念住를 닦아야 한다. 그리하여 자상自相과 공상共相으로 몸[身]ㆍ느낌[受]ㆍ마음[心]ㆍ법法을 관하는 것이니, 이른바 관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1취趣에만 쓰는 것이다. 이 법과 나머지 다른 법의 차별을 분별하여 차별된 뜻이 있는 것을 자상을 관하는 것이라 하고, 이 법과 나머지 다른 법을 분별하여 차별된 뜻이 없는 것을 공상을 관하는 것이라 한다. 다시 자상을 관하는 것은 이른바 몸의 모든 곳의 차별상을 관찰하는 것이며, 공상을 관하는 것은 이른바 모든 곳이 똑같이 몸의 모습임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몸을 청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관하면 청정하지 않은 것을 청정한 것이라고 하는 뒤바뀐 생각을 다스린다. 느낌[受]이 고통임을 관하면 능히 고통스러운 것을 즐거운 것이라고 하는 뒤바뀐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 마음이 항상하지 않음을 관하면 능히 항상하지 않음을 항상한 것[常]이라고 하는 뒤바뀐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 법이 나[我]가 아님을 관하면 능히 나 아닌 것[非我]을 나라고 하는 뒤바뀐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 마치 사람이 이미 똥 자체가 청정하지 않음을 관찰하고 나면 그 똥에서부터 생겨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미 신체가 청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관하였으면 5취온取蘊에 대해서도 모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으니, 나중의 세 가지 염주念住도 능히 총체적으로 조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능히 결택決擇에 수순하며 사소성思所成에 섭수되는 선근을 이미 설하였다.
곧 수소성修所成에서는 어떤 선근을 낳는가? 게송을 설해서 말하였다.
이로부터 난법煖法이 생겨
4성제聖諦를 모두 관찰하고
16행상行相을 닦으니
제일의 정법頂法도 역시 그러하다.”
논論에서 말하였다.
“닦아서 이루어진 순결택분順決擇分의 처음 선근善根이 일어나니, 이름하여 난법煖法이라고 한다.
이는 총연공상總緣共相의 법념주法念住의 차별로, 번뇌를 능히 태울 수 있는 성도聖道의 불이 있기 전의 모습[前相]이다. 불을 일으킬 때 처음에는 따뜻함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능히 4성제聖諦의 경계[境]를 모두 관찰하며, 이로 인하여 16행상行相을 모두 닦게 된다.
즉, 고성제苦聖諦를 관찰하여 네 가지 행상[四行相]을 닦으니,
첫째는 비상非常[유有가 다시 무無가 되기 때문에 비상이라고 한다.]이요,
둘째는 고苦[수축[隨逐:煩惱]이 서로 괴롭히므로 고라고 한다.]이며,
셋째는 공空[본래 없음을 관찰하므로 공이라 한다.]이며,
넷째는 비아非我[자재自在하지 않으므로 비아라 한다.]이다.
그리고 집성제集聖諦를 관찰하여 네 가지 행상을 닦으니,
첫째는 인因[상사과相似果를 낳으므로 인이라 한다.]이요,
둘째는 집集[능히 유전流轉하게 하므로 집이라 한다.]이요,
셋째는 생生[능히 생사生死를 이끄므로 생이라 한다.]이요,
넷째는 연緣[능히 서로 화합하게 하므로 연이라고 한다.]이다.
그리고 멸성제滅聖諦를 관찰하여 네 가지 행상을 닦으니,
첫째는 멸滅[생사가 서로 어긋나게 되므로 멸이라고 한다.]이요,
둘째는 정靜[번뇌의 불에서 벗어나므로 정이라 한다.]이며,
셋째는 묘妙[모든 법에서 뛰어나므로 묘라고 한다.]이며,
넷째는 리離[능히 생사를 버릴 수 있으므로 리라고 한다.]이다.
그리고 도성제道聖諦를 관찰하여 네 가지 행상을 닦으니,
첫째는 도道[능히 비품非品에 이르므로 도라고 한다.]이고,
둘째는 여如[뒤바뀌지 않으므로 여라고 한다.]이며,
셋째는 행行[성스럽게 실천된 것이므로 행이라고 한다.]이며,
넷째는 출出[생사를 뛰어넘어 구하므로 출이라고 한다.]이다.
[이 주注의 내용은 『아비담심론阿毘曇心論』을 참고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이 난법煖法을 닦고 나면 그 다음으로 정법頂法이 일어난다. 이는 마치 산 정상의 사람이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 여러 어려움이 없다면 반드시 이 산에서 저 산에 다다를 수 있지만, 만약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물러나 돌아와야 한다. 만약 여러 어려움이 없으면 필히 인忍에 다다를 수 있지만, 이미 인의 위치[忍位]에 들어가면 4제諦의 경계의 극極에서 견디고 참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세제일법世第一法이 일어나는데, 세계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4제의 경계를 관찰하여 16행상을 모두 닦게 되면, 점차 견제見諦에 접근하게 되어 욕계欲界의 고제苦諦를 연緣으로 하여 하나의 행상을 한 찰나에 닦는 것이다. 즉, 무간無間의 이생위離生位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위에서는 결코 더 이상 상속할 이치가 없는 것이다.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다시 도道가 생기는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세제일법世第一法과 무간無間에
욕계欲界의 고제苦諦를 연緣으로 하여
무루無漏의 법인法忍을 낳으며,
법인 다음에 법지法智를 낳는다.
다음으로 그 밖의 계界의 고제를 연으로 하여
유인類忍과 유지類智를 낳으며,
집제集諦와 멸제滅諦와 도제道諦를 연으로 하여
제각기 넷을 낳는 것도 그러하다.
이와 같은 16찰나의 마음을
성제현관聖諦現觀이라 이름하였다.”
논에서 말하였다.
“세제일世第一의 선근善根으로부터 무간無間에 욕계의 고성제를 소연所緣의 경계를 삼아 무루無漏의 법인法忍이 생기니, 이러한 인忍을 이름하여 법지인法智忍이라고 한다.[즉, 고법苦法에 무시無始 이래로 신견身見으로써 아我와 아소我所라고 미혹하게 집착함을 이른 것이다. 지금 처음으로 저것을 보고 인가忍可하고 현전現前한 것이므로 고법인苦法忍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것은 능히 후에 고법지苦法智의 생生을 이끈다.]
욕계의 고성제苦聖諦를 소연의 경계로 삼아 고법인과 고법지가 생겨나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 고법지와 무간에 그 밖의 다른 모든 계界와 고성제를 소연의 경계로 삼아 유지인類智忍이 생기는데, 이를 유지類智라고 이름한다.[즉, 최초로 모든 법의 참된 이치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법지法智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후의 경계의 지혜는 앞의 것과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유지類智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으로, 이 뒤의 것은 앞의 것을 따라 경계의 뜻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욕계와 다른 계의 고제苦諦를 연으로 하여 법인法忍ㆍ유인類忍ㆍ법지法智ㆍ유지類智의 네 가지가 생기듯이 그 밖의 다른 3제諦를 연으로 하여 제각기 네 가지가 생기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이는 하나하나의 제諦를 연으로 하여 네 찰나의 마음[四心]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차례로 16찰나의 마음이 있으니, 이를 모두 성제현관聖諦現觀이라고 이름한다. 이는 삼계의 4성제의 경계를 차례로 현전시켜 참되게 관찰하기 때문에 이를 현관現觀이라고 이름한다.”
[동자함同字函 제10권]
『대장일람집』 7권(ABC, K1504 v45, p.536b01)